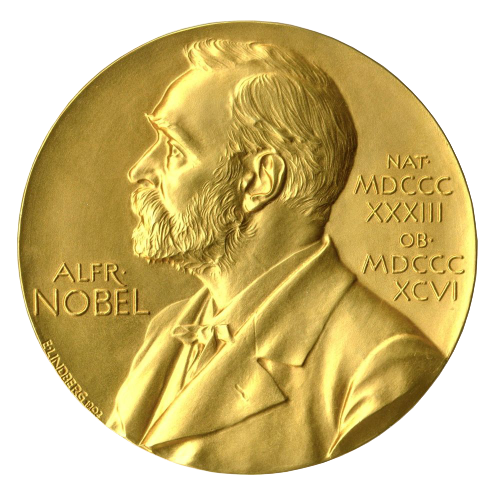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지만 출판계는 울상이다. 대중들에게 생소한 작가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 노벨문학상 특수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점가와 출판계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만을 기다려 왔다. 2019년의 경우 45년 만에 수상자 두 명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서 업계는 상당한 매출을 챙겼다. 지난 2019년 올가 토카르추크와 페터 한트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 교보문고에서는 수상자 발표 다음날인 1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수상자들의 책 500여 권이 판매됐다.
예스24와 알라딘 등에서도 11일 정오 기준 수상자 서적 800권이 판매됐고 교보문고는 영업점마다 노벨문학상 기획전을 열며 '노벨문학상 특수'를 누렸다. 특히 토카르추크의 작품 '태고의 시간들'은 기존엔 일주일 평균 한 권밖에 팔리지 않았으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하루 만에 152권의 판매량을 보였다. 수상자들이 국내에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고 여러 권의 번역서가 출간됐다는 점이 노벨문학상 특수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 소설가 압둘라자크 구르나인데 문제는 국내 인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르나는 국내 번역본이 단 한 작품도 없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서적을 독자들이 읽으려 해도 번역본이 없으니 결국 외면을 받게 되고 이로써 노벨문학상 특수 효과는 옛말이 됐다는 것이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구르나의 작품 번역에 나선 출판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구르나의 작품은 대부분 소설이다. 시보다 번역 기간이 몇 배나 소요되는 소설이다보니 번역본이 출간된 이후엔 노벨문학상 특수 효과가 기대 이상 발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벨문학상 특수 효과를 맛보지 못한 건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엔 글릭이 노벨문학상이 수상에 성공했지만 이 또한 국내 번역본이 단 한 권도 없었다. 코로나19로 매출난을 겪고 있는 서점가에선 노벨문학상 특수가 한줄기 희망인 셈이었으나 올해도 노벨문학상 특수는 실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서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노벨문학상 특수는 사실상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