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뉴스앤북 ]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아무래도 로맨스 영화가 잘 어울리는 시즌이 아닐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나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와 같은 노라 애프런(Nora Ephron)의 영화부터 크리스마스의 고전이 된 <러브 액츄얼리>와 같은 작품까지, 우리가 떠올리는 많은 로맨스 영화들의 배경이 겨울이라는 사실은 사랑 이야기가 지닌 안온함이 겨울의 추위와 외로움(?)을 달래주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로맨스 영화라는 장르 안에 많은 영화가 떠오르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2010년대 이후의 작품들 중에 ‘전통적’ 로맨스 영화의 설정과 공식을 따르는 작품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 영화사에서 로맨스 영화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꾸준히 제작되고는 있지만 영화 안팎에서 관객의 관심이나 감동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로맨스 영화는 낭만적 사랑 이야기와 궤를 같이 하기에, 예전처럼 낭만적 사랑의 신회를 믿지 않는 시대에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에 우리가 로맨스 영화라고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 중에 화제가 됐던 작품은 대표적으로 <문라이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과 같은 ‘퀴어’ 로맨스 영화이다. 퀴어 로맨스 영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일까. 물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엔 무언가 부족함이 남는다.
문화기획자이자 영화연구가 김호빈 저자가 쓴 『로맨스 영화를 읽다』는 영화사 초기의 스쿠르볼 코미디를 시작으로, 90년대 ‘로맨스 영화 황금기’의 작품들을 거쳐 오늘날의 다각화된 로맨스의 양상을 보여주는 영화까지, 하나의 장르의 변화와 시대적 감응을 성실하게 포착한 책이다. 책에서 정말 다양한 시대의 로맨스 영화를 다루는데, 그 중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여러 번 생각해볼 만하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복기할 것들이 정말 많은 작품인데, 저자는 그 중 두 가지 장면에 주목한다. 화가 마리안(노에미 멜랑)은 엘로이즈(아델 에넬)라는 귀족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섬에 도착한다. 정략적인 결혼이었고, 18세기엔 결혼 전에 상대 측에 초상화를 보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엘로이즈는 결혼을 하기 싫어 초상화 그리기를 거부한다. 마리안은 본의 아니게 엘로이즈를 몰래 관찰해서 그린다. 제대로 보진 못하지만, 마리안은 직업 화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관습, 규칙, 이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엘로이즈를 그릴 순 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본 엘로이즈는 '이게 나와 닮았나요?'라고 반문한다. 마리안은 규칙에 따라 그렸다고 답한다. 그러자 엘로이즈는 '그럼 그림에는 생명력은 어디 있죠?'라고 다시 반문한다. 이 첫 번째 초상화에서 마리안은 그림의 대상을 보지 않고 아는 대로 그렸다. 이 구도는 영화 연출 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것은 쇼트와 역쇼트인데, 영화 초반부에 마리안이 몰래 엘로이즈를 그린다는 설정처럼, 엘로이즈는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만 존재한다. 쇼트(관찰자)와 역쇼트(대상)의 위치가 고정되어 전개되는 것이다.
많은 로맨스의 영화에서 쇼트(관찰자)에는 남성이, 역쇼트(대상)에는 여성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초반부도 이처럼 전개된다. 첫 번째 초상화에서 일반적인 관찰 대상으로서 엘로이즈가 존재했다면, 두 번째는 엘로이즈가 선뜻 모델로 나서 마음껏 그려보라고 한다. 이때 영화적 시선의 방향이 그림은 마리안이 그리고 있지만 엘로이즈가 쳐다보면, 마리안이 보고, 엘로이즈의 시선에 따라 마리안이 나온다. 상호적으로 쇼트와 역쇼트가 반복되면서 누가 관찰자이고 대상인지 분간이 안 되게 그려지는 것이다. 첫 번째는 관습, 이념에 따라 아는대로 그린 그림이라면, 두 번째 초상화는 제대로 관찰한 그림인 것이다. 이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은 단순히 관찰자가 중심이 되어 그리는 게 아니라, 상호적인 시선과 감정의 교환에 따라 그려지는 것, 마치 둘의 시선이 교차하면서, 감정의 교환이 이뤄지고 뜨거운 사랑의 불이 붙는 것처럼, 이것은 상호적인 사랑의 양상을 강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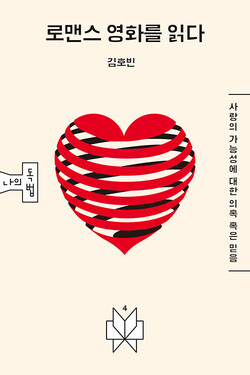
영화 중간에 나오는 에우리디케와 오르페우스 신화에 대한 둘의 해석도 흥미롭다. 마리안은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본 건 연인과 영원히 이별하는 절절한 경험은 일생에 단 한 번일 수도 있기에, 훌륭한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반면 엘로이즈는 그것이 연인인 에우리디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오르페우스의 일방적인 돌아봄이 아니라 요청에의 응답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적인 상황이자 공감대의 형성, 감정의 교류이다. 그림이 상호의 시선으로 그려지듯이, 이번에도 연인은 공감대를 이뤘기에 돌아본 것이고, 이때 오르페우스는 그가 알고 있는 사랑의 관념이 아니라 연인의 얼굴 그 자체를 본 것에 가깝다.
에우리디케 신화는 이 영화에서 반복된다. 애초에 엘로이즈와 마리안의 사랑은 이뤄질 수 없기에 이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서둘러 성을 벗어나려는 마리안을 엘로이즈가 부른다. 그녀의 요청에 따라 뒤를 돌아보니,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엘로이즈가 서 있다. 신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장면의 의미와 마리안이 본 것은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했듯,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영화라는 것은 재현의 매체가 아니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현 이전에 어떤 시각적, 청각적인 형상을 담은 것이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의미를 인지하는 것은 공고화된 관습, 이념, 규칙이 작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재현과 의미 이전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시청각적 형상을 우리는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 지점 자체가 영화예술이 지닌 본질인 것이다. 퀴어 로맨스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을 담는 것이다. 안 봐도 뻔하게 알 것 같은 사랑의 양상으로부터 벗어나, 봐도 모르는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퀴어 로맨스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나아가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