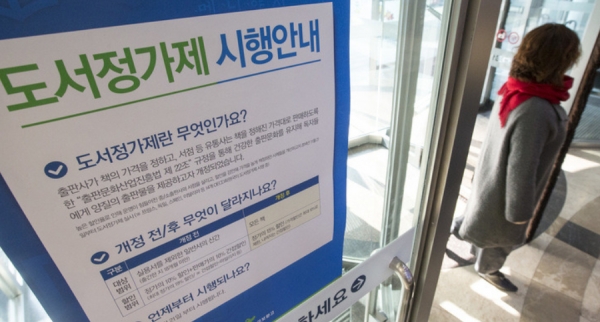
약 4개월 남겨둔 오는 11월 ‘일몰’을 앞둔 도서정가제 개정을 두고 출판·서점·콘텐츠업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출판업계와 서점업계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같은 업계 내에서 또한 규모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네서점부터 인터넷 대형서점까지, 소규모 단행본 위주 출판사부터 실용·학습서를 주로 펴내는 대형 출판사까지 각기 도서정가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는 게 논쟁의 발단이다.
처음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02년 이래 책의 정가는 높은 할인율 때문에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전까지의 도서정가 정책에 실효성이 부족했던 탓에 책 한 권을 팔아 출판사에 돌아오는 액수도 갈수록 줄어들어 출판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출판계는 신간 할인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를 개정하면 소비자들에게 다소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동네 서점에 돌아가는 책값이 늘어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해마다 발간하는 ‘출판시장 통계’ 보고서를 보면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 대규모 할인행사까지 진행했음에도 2014년 주요 86개 출판사의 총매출액은 5조 501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본격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5년엔 73개 주요 출판사의 총매출액이 5조 21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다. 지난해 통계를 놓고 보면 주요 출판사 수는 70개로 2015년보다 줄었지만 이들 출판사의 총매출액은 5조 3836억 원으로 늘었다.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 위축을 막는 데 톡톡한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대전 한 동네서점 사장 김 모 씨는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된 지도 6년째이지만 출판업계에 제대로 된 몫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일부 대형서점이 차지하는 몫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한 문예창작학과 교수 A 씨는 “어느 정도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만큼 손을 볼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는만큼 정부 차원에서 동네 서점 등을 부흥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개정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